미국의 작가 브루스 더피(Bruce Duffie)와 피에르 불레즈의 인터뷰를 번역해서 올려본다. 이하의 번역은 일체의 철학, 원칙이나 기준 없이 직역 및 의역, 오역을 마구잡이로 섞어 하였음을 밝혀둔다.
Pierre Boulez Interviews with Bruce Duffie . . . . . . . . .
Pierre Boulez was born in 1925 in Montbrison, France. He first studied mathematics, then music at the Paris Conservatory (CNSM), where his teachers included Olivier Messiaen and René Leibowitz. In 1954, with the support of Jean-Louis Barrault, he founded
www.bruceduffi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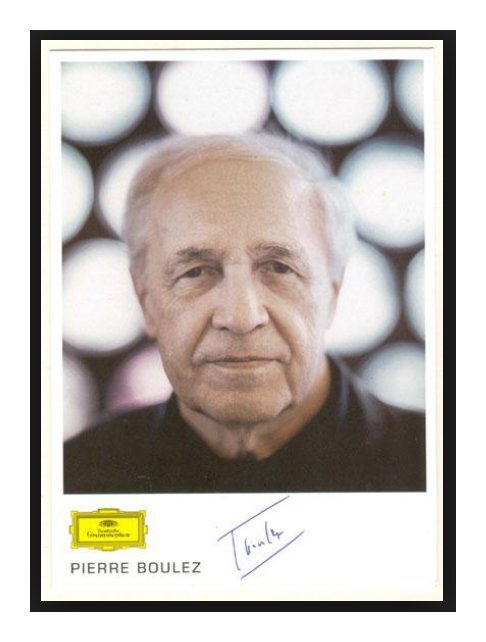
피에르 불레즈는 1925년에 프랑스 몽브히송(Montbrison)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 수학을 공부하다 파리 콘서바토리(CNSM)에서 올리비에 메시앙(Olivier Messiaen)과 르네 라이보비츠(René Leibowitz)를 사사했다. 1954년에 장루이 바로(Jean-Louis Barrault)의 도움으로 도맹 뮈지칼(Le Domaine Musical)을 창립해 1967년까지 음악감독을 지냈다. 1958년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을 맡아 지휘자로도 활동해 오고 있다. 1960년부터 1962년까지 바젤 음악아카데미에서 작곡을 가르쳤다. 작곡가 겸 지휘자이자 교육자로서 20세기 음악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혁신적인 관념으로 수많은 젊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26개 그래미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상을 받은 음반들을 남겼다.

위의 간략한 일대기만으로 불레즈라는 음악의 거장(단순히 20세기 음악의 거장이 아니라 음악계 전체의 거장)을 정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의 90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인터뷰를 웹에 게시한다. 그에 대하여는 아무리 경의를 표해도 과하지 않지만 동시에 어떤 경의도 그에 대한 것으로서는 불충분할 것이다. 그는, 간단히 말하자면, 불레즈이다. 불레즈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곧 기대와 존숭의 표현이다. 우리는 그의 업적에 대해 그저 감사해할 수밖에 없다.
몇 가지 계기들 덕분에 공개된 장에서나마 잠시나마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영광이었다. 그는 지금 여기 올리는 두 차례의 긴 인터뷰를 위해 나를 바로 옆에 앉게 해주었다. 이 인터뷰는 1980년대 중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공연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시카고에서 이루어졌다(이 당시 불레즈는 정기적으로 또 자주 시카고 심포니를 지휘했으나, 정식 직위는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받게 된다). 불레즈의 관심사는 넓고도 깊었으며 우리의 대화 또한 어느 한 주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첫 번째 대화에서는 오페라에 대해, 두 번째에서는 그의 작품과 현대음악 전반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나 지금이나 그를 곤혹스럽게 하는 발언("오페라극장들을 다 폭파해야 한다"-1968년)로 대화의 포문을 열어 보았다.


지난 20년 간 폭파된 오페라극장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목이 좀 과하게 뽑아진 감이 있는 것 같다. (웃음) 극장은 오페라를 공연하기에는 조건이 너무나 좋지 않다. 리허설을 하면서 캐스팅도 바꿔본다든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데 그런 게 없지 않나.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나아진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오페라 지휘는 기획공연에서만 하는 편이다. 가령 바이로이트 페스티벌만 하더라도 그런 악조건들이 없고 연출을 다듬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아졌다. 리허설을 제대로, 또 충분히 해야 하는데 오페라극장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극장을 벗어나야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 또 어떤 부분들은 극장에서 할 때보다 더 잘 되기도 한다.
지휘자, 악단, 가수들 모두에게 그 곡에 대한 수없는 경험이 있더라도 그런가?
수없는 경험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달렸다. 아무리 수없는 경험을 해본 곡이고 또 잘 알려진 곡이라 해도, 반 년 이상 연주를 안 해본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면 좋은 공연이 나올 리 없다. 관현악만 보더라도 세상에 리허설 없이 공연하라는 걸 달가워할 악단은 없다. 그 무대에서 최소한 두 번 이상은 해봐야 한다. 하물며 오페라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겠나. 성악이며 연출이며 모든 것에 리허설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수없는 경험이라는 것은 단지 '수없는 땜질 경험'일 뿐이다. 작가님께서도 그런 류의 공연을 많이 보시지 않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너나 할것 없이 연습 안한 티가 나는 것 말이다. 그런 식으로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창조낼 수 없다.
(짓궂게) 즉흥성이 꼭 나쁜가. 그것으로 서로 일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아니다. 잘 되면 다행이겠지만, 대체로 연주자들이 각자의 즉흥성을 발휘할 경우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예측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겠나. 지금 극장공연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까다로운 일이다. 가령 일전에 셰로(Patrice Chéreau, 1944-2013) 감독과 함께 오페라를 했었는데, 공연을 목전에 두고 가수 한 명이 갑자기 병이 나서 이틀만에 대타를 구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연출이라는 게 배우에 맞춰서 하는 법인데, 배우 한 명을 갑자기 교체해 버리니 결과가 어땠을까. 연극과 마찬가지로 오페라 연출 또한 촉박한 시간적 조건 하에 흡입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가수를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다라면 작품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오래된 질문을 해보겠다. 오페라에서 가사와 음악 중 뭐가 더 중요한가.
슈트라우스조차도 답을 모를 바로 그 질문! (웃음) 실제로 슈트라우스는 확답을 꺼려했는데 아마 작가님도 답하기 어려우시리라 생각한다. 가사와 음악 간의 우열은 -심지어 하루 동안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가령 모차르트의 아리아에서는 음악 쪽의 중요성이 더 크지만, 레치타티보에서 줄거리와 가사가 명료히 전달되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들의 행동과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흡입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이를테면 슈트라우스의 <낙소스의 아리아드네(Ariadne auf Naxos)>에서도 체르비네타의 가사를 다 듣고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 콜로라투라에서 딕션이 언제나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서막에서 작곡가와 무대감독 등이 하는 대화만큼은 반드시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짜임새가 좋은 곡에서는 으레, 명료한 가사전달의 필요성이 패시지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가 많은 법이다. 또 바그너의 작품들처럼 선율적인 곡에서도 가사가 매우 중요한 패시지가 등장한다. 바그너가 쓴 글들을 보면 자신의 곡에서는 가사와 음악이 동일체이며 분리 불가능하다는 언급이 자주 나오는데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대사와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음악에 대한 이해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은 심지어 바그너의 곡에서도 타당한 것이다.
외국의 오페라를 공연할 경우 가사를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렇지는 않다. 다만 얄궂게도 영상매체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셰로 감독과 함께 했던 <니벨룽의 반지(Der Ring Des Nibelungen)> 공연이 영국과 프랑스에 자막이 달려 방송된 일이 있는데 그 때 자막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사와 음악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막은 사실상 유일한 것이다. 물론 애당초 가사 자체가 독일어의 소노리티를 전제로 써진 것이고 다른 언어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어차피 내용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인공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미리 텍스트를 다 읽고 암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데, 곡에 집중하기는커녕 저 대사가 무슨 뜻이었지 하며 기억을 쥐어짜기에 급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맛보지도 않고 삼켜 버리는 셈이다. 모든 주의가 가사로 집중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눈으로 가사를 읽을 수 있다면 -따지고 보면 멀티태스킹이지만- 어렵지 않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가사와 음악 간의 명확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할 여유가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음악가가 스코어를 볼 때처럼 곡을 대할 수 있다. 강력한 총주는 그 자체 어렴풋이라도 감명을 주지만, 내용을 완벽히 이해한다면 만족도가 확실히 높게 된다.
극장 공연시에 번역 자막을 영사기로 띄워보신 적이 있는가.
없다. 공연할 때 자막을 비추는 건 대체로 쉽지 않다. 독일 고유의 빛깔이 짙은 부분에서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3개 이상의 자막을 띄우자면 무대 전체가 글자밭이 될 건데 가수들 얼굴을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극장에서 번역자막을 띄우는 추세이다. 가사전달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적절한 공간을 잡아서 잘만 한다면 그럴 것이다. 모양새가 이상하면 안 된다. 영상매체라면 그냥 화면 밑에 띄우기만 하면 되니 공간을 덜 차지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새하얀 자막은 조도가 낮은 장면에서는 거슬리는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만 있다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겠다. 그런데 극장에서 자막을 띄운다면 무대 꼭대기 쪽 아닌가?
그렇다. 커튼 바로 앞 위쪽에 작은 스크린을 띄우는 것이다.
오른쪽이나 왼쪽에?
꼭대기 중앙에.
그러니까 결국 꼭대기인 것인데, 그럼 장면과 글자의 비율이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영상에 비해 자막 읽기가 확실히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을 것 같기는 하다.
바그너 외에 가사와 음악을 강하게 결합시키는 작곡가로는 누가 있나.
없는 것 같다. 바그너만큼 창의적으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그 사람이 쓴 텍스트들 중에는 가사로 사용되기 15년, 20년도 더 전에 완성된 것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단어 몇 개만 조금 바꿔서 바로 음악에 입힌 것이다. 스케치와 완성본을 비교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바그너는 초안에서 그리 많이 고치지 않는 편이다. 완성 직전에 가서 소노리티에만 손을 좀 대는 정도다. <신들의 황혼(Götterdämmerung)>에서는 수정을 좀 많이 한 편인데 이는 관념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긴 공백기 동안 관점이 완전히 바뀐 후였기에 이 곡의 결말을 어떻게 지을지를 놓고 상당한 고심을 했다. 정말로 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니벨룽의 반지> 마지막 5분여 동안을 어떻게 보시나.
상당히 압축적인 결말이다. 음악은 아름답지만 연출면에서는 다소 의아한 데가 있는데 너무 급작스럽기 때문이다. 라인강이 모든 것을 다 휩쓸어버리더니, 반지는 다시 사라져버리고, 브룬힐데는 불 속으로 뛰어든다. 연출면에서 최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걸 잊어버릴 만큼 해당 부분 음악이 워낙에 황홀하다. 이 부분을 셰로 감독이 아주 훌륭하게 풀이해주었는데, '의문'과 함께 끝내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 모든 군중들(합창단)이 갑자기 벌어진 일에 대해 어리둥절해 한다. 그러다 시선을 관현악에 고정시켜 미동 없이 음악에만 집중하다가, 음악이 잦아들면서 하나둘씩 돌아서며 어둠 속에서 관객들을 응시하는 것이다. 이 순간 관객들을 응시하는 군중들은 극이 진행되는 내내 관객의 거울이었던 것이다. 대단히 탁월한 순간이다. 반지, 신들의 황혼은 이렇듯 물음표와 함께 끝나는 것이라고 본다. 모든 것이 반복될 것이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다. ◈
(계속)
'음악 > 불레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에르 불레즈 [8] - <파생 2> (0) | 2017.03.09 |
|---|---|
| 피에르 불레즈 [7] - <응답(Repons)> (0) | 2017.02.28 |
| 피에르 불레즈 [6] - <한 겹 두 겹(Pli selon pli)> (0) | 2017.02.28 |
| 피에르 불레즈 [5] - <메사제스키스(Messagesquisse)> (0) | 2017.02.26 |
| 피에르 불레즈 [4] - <노타시옹(Notations)> (0) | 2017.02.23 |